사랑방
글 수 1,844
수송을 생각하며
1
쌉싸름한 낙엽 냄새가 진해졌나 싶었는데 한차례 비가 내리고는 그만 겨울이 와버린 것 같다. 이 맘 때면 어떻게 사느냐 보다는 왜 사느냐는 식의 철학적 상념에 젖기도 했는데 이젠 그럴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 당장 먹을 저녁거리와 아이가 입을 옷, 교육 문제 등이 온통 내 시야를 가로막고 있다. 철저하게 생활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난, 이제 한 아이의 엄마인 것이다. 삶은 좀 더 단단하고 무게감 있게, 현실적으로 내 앞에 서 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면 비로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은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지난 밤, 후둑거리는 빗소리에 마음이 헛헛해졌다. 젊었던 시절에 많은 시간을 보냈던 수송 교회에서의 일들을 되짚어 보았던 것은 아마도 내가 얼마 전부터 아이를 데리고 수송 교회를 나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소 쑥스럽게 이야기하자면, <수송>은 내게 고향 같은 곳이다. 고향처럼 정겨운 느낌이 든다는 말일 텐데, 쑥스러운 기분이 드는 것은 내가 수송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도 해본 적이 없다는 자격지심에 기인할지도 모른다. 난 다만, 오랜 시간을 수송에서 보낸 것 같다. 굵고 짧은 것이 아니라 가늘고 길게,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가늘고 길었던 그 시간동안 난 수송 교회의 많은 분들을 알게 되었고 깊이 있는 만남은 갖지 못했더라도 오랜 시간의 덕분으로 그들에게 친근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수송을 알게 된 것이 벌써 십 오년이다. 휠체어에 의지해 교회에 다니겠다는 어머니를 모시고 오게 된 곳이 수송이었다. 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했던 수송의 많은 분들이 있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을 보면, 그래서 수송에 오면, 어머니가 생각나곤 한다.
어머니 때문에 다니게 된 교회였기에 신앙심이 깊지 않았고 교회에도 별 흥미가 없었다. 그런데 청년부에 참석한지 일 년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청년들과 교류를 하면서 관계가 만들어졌다. 친한 사람들이 생겼다. 같이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고 그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쳐지고 싶었다. 청년부에서 보냈던 시간은 내게 소중하다. 그 시간 속에 내 젊은 날의 긴 자락이 담겨 있다.
2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은 더 착해지는 것 같다. 눈물이 많아졌다. 나이가 들면서 그 세월동안 경험이 많아지니 다른 이들의 마음이 미루어 짐작되곤 한다. 수송이 내게 소중한 곳이란 생각을 하다가 다른 한 친구가 생각난 것도 바로 그러한 ‘동감’ 때문일 것이다.
처음 그를 보았을 때였다. 인치주. “인씨라는 성도 있어?” “왜 저렇게 생김새가 자유분방한 거야?” 그를 조금 알았을 때는 “나서는 것을 좀 좋아하는 것 같군”, 하고 생각했다. 시간이 흐르고 그 친구의 많은 장점들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척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청년부에서 보았던 치주는 리더십이 있었고 비교적 유능한 편이었으며, 비난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에게 포용심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제는 인집사라고 지칭해야 할 것 같지만, 그냥 하던 대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편할 것 같다.) 그는 홍목사님과 고목사님의 지지자였으며, 교회 안에서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때론 껄끄러운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치주의 청년부 생활은 건강했고 활기찼다. 교회 안에서 사회를 배우고 자아를 실현했다. 수송은 분명 그에게 소중한 삶의 장소였다.
그런 치주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 친구가 무슨 일로 수송에 나오지 않는지를, 그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나처럼 무성의하게 다닌 사람도 그러한데, 치주에게는 수송이 얼마나 더 소중한 곳이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에, 마음이 아팠다. 수송을 떠나는 과정에서 그가 느꼈을 그 섭섭함이, 깊었을 마음의 상처가, 느껴지는 것이다.
3
지금의 교육관 건물이 지어지기 전이었던 수송의 모습이 가끔 떠오른다. 무척 예쁜 교회였다. 아담한 본당 건물이 하나 서 있고 그 앞으로 흙길이 운동장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다. 교회 뒷길에는 언제나 키 큰 나무들이 무성했고, 본당 건물에서 마주한 흙길 저쪽에 등나무가 있었다. 등나무 아래에 쉼터가 있었고 주변에 키 낮은 풀과 꽃들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계절의 운치가 물씬 풍겨나던 곳. 등나무 아래에 앉아 올려다보이던 빨간색 본당 건물. 벚꽃처럼 하얗게 쏟아지던 햇빛에 눈을 돌려 뒤돌아서면 마주치던, 사람들의 그 얼굴들.
지금의 수송은 규모가 커졌고 건물의 활용도나 효율성이 분명 더 나아졌다. 목사님들의 사택과 중고등부실과 청년부실, 식당과 도서관, 쉼터 등이 모두 쓸모 있게 꾸려지고 있다. 하지만 예전의 수송도 좋았다. 소박했고 아담하게 예뻤고, 무엇보다 추억 속의 장소인 것이다.
교회의 외관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수송은 내게 고향 같은 곳이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 고향의 의미 아닐까. 수송에 가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겨운 얼굴들이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래서 수송에서 느끼는 고향의 느낌이 그만 퇴색해버릴까 봐 아쉽고, 또 아쉽다. 어쩌면 난 수송을 다니더라도, 수송을 그리워하게 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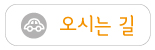



 Powered by XE
Powered by X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