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작은도서관
글 수 198
하나님은 아름다운 창조물을 '그리운 것'들과 나누고 싶었나 보다
▲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책의 서두는 작가 공지영이 수도원 기행을 떠나기에 앞서 짐을 꾸리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유럽의 수도원을 여행하게 된 경위와 그 간의 일상들을 보여줌으로써 나는 쉽게 이 여행에 동행할 수 있었다. 물론 카톨릭 신자이기에 쓸 수밖에 없는 '하느님'이란 활자가 약간 내 눈에 거슬리긴 했지만, 18년만에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신앙의 고백 앞에 '하느님'이면 어떻고, '하나님'이면 어때, 하며. 어느 새 나는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유럽 수도원 기행의 여정은 이렇게 진행된다. 파리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아르정탱(Argentan)에 있는 '베네딕트 여자 봉쇄 수도원'이란 곳에 가게 된다. 봉쇄수도원이란 말이 참 낯설다. 한번 들어가면 스스로 원해서 나올 때까지는 쇠창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곳이란다. 머나먼 이국 땅, 그것도 봉쇄수도원에서 만난 두 분의 한국 수녀님들이 인상적이었고(도대체 그 곳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테러블리 해피"라고 말한 라타피 할머니의 섬김의 삶과 작별의 눈물. 모두 내게 가슴 뭉클한, 아름다운 장면들로 다가왔다.
작가는 리옹을 거쳐 작가가 내심 기대했던 테제(Taize) 공동체에 도착한다. 기독교가 쇠퇴해가는 유럽의 한복판에 누가 준다는 돈도 안 받고, 그래서 커다란 성당도 못 짓고, 그러나 자유스럽고 아름다운 성당을 가진 공동체. 그런 그 곳의 '화해의 교회' 입구에는 "여기 서 있는 그대 화해하십시오" 라고 써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24>.
기독교가 쇠퇴해가는 유럽에, 그것도 세계 각국에서 애써 자기 돈 내고, 가장 가난한 수도원까지 찾아온,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여기 서 있는 그대 화해하십시오"라니?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여정은 스위스 프리부(Freibourg)의 '길 위의 성모 피정의 집(NOTRE DAME DE LA ROUTE)'이란 곳이다. 책에 실린, 숙소의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흰 눈을 머리에 얹은 알프스 사진은 말 그대로 그림 같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장 신부님(張 아님)의 자상함과 따뜻함을, 작가는 남편의 표현을 빌어 '처갓집에 온 듯한 기분'이라고 했다.
스위스를 떠나 이탈리아의 베니스를 거쳐 독일의 뮌헨에 다다른다. 주말 저녁 뮌헨시내 살롱 안에 탁자마다 혼자 앉아 있던 중년의 사람들의 고독한 모습을 보며, 잘 산다는 의미가 무얼까... 생각하던 작가는 괴테의 말 -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일 뿐" - 을 빌어 이렇게 고백했다. "항복합니다, 주님." 써 놓고 보니 우리말이 이상하기도 하다. '항복과 행복' 획 하나 차이의 낱말.
주님 앞에 항복해야만,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을 작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는 혈통, 율법, 열정, 그리고 학식으로나, 가진 게 참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푯대 되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뮌헨에서 남쪽으로 알프스를 향해 1시간쯤 걸리는 킴지(Chiemsee) 수도원에 들렀다가, ICE(이체) 밤 기차를 타고 새벽에 도착한 곳이 함부르크다. 함부르크 한인 교포 사회가 빌려쓰는 함머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오스나 브릑(Osna Br ck) 베네딕트 여자 봉쇄수도원을 거쳐 마리아의 언덕에 위치한 몽포뢰 수도원에 도착한다.
몽포뢰 수도원의 비게스 신부님이 하신 말씀은 나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했다. "공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와 나눔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라도 결여되면 함께 살기가 어렵지요." 절제와 나눔이 비단 수도원 안의 공동생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부딪히고 겪는 많은 문제들이 모두 '절제와 나눔'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니 말이다.
한 달이 조금 못 되는 여행을 마치고 작가는 고백했다. 책의 서두에, 어릴 적 성당에서 시립고아원에 봉사하러 갔을 때 그곳에 버려진 아이들을 보고 작가는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뭐 하러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도 우리도 이 고생인가 말이에요." 그 후 성당을 떠날 때까지 끝끝내 그 대답을 얻을 수 없었다던 작가는 오늘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창조물을 '그리운 것'들과 나누고 싶었나 보다. 좋은 걸 보면 생각나는 게 사랑이니까. 사랑은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신 것이다. 18년 동안 물끄러미 바라만 보면서, 당신이 가진 전지전능의 능력을 오직 기다리는데 사용하신 것이다. 오래도록 헤매어 다니던 한 사춘기 소녀의 영혼에게 하나님은 이제야 대답을 주신다. 이렇게 오래도록 헤매고 다닌 후에야."
글 솜씨 좋은 작가가 써서 일까? 나는 이미 그녀에게 동화되어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어 갈수록, 그녀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있었다. 수도원을 돌아다니며. 그 곳에서 '풍광'이 아닌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던 그녀는, 어느 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었다. 책을 덮으며, 나 또한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이유에, 그 사랑에, 명치끝(?)이 아파 왔다.
내게도 늘...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으로 간직되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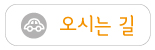



 Powered by XE
Powered by X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