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작은도서관
글 수 198
[모두가 이기는 ‘껴안기 싸움’] - 김소연 / 시인
나는 동네에서 조그마한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이 왔으니, 함께 봄 냄새가 맡고 싶어서 예쁜 꽃을 사다 계단참에 놓았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한마디씩 건넵니다. 봄이 느껴져서 좋다며 따뜻하게 웃어줍니다. 우리 집에도 이런 꽃 사다놔야지, 혼잣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씨익 웃곤 하지만, 속마음까지 웃어지진 않습니다. 좋은 걸 보면 ‘우리 집’ 혹은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쁜 화분을 살 때 하나 더 사서, 우리 도서관에 선물해 달라 말하고 싶기도 하고, 애들 학교 교실에 갖다 주라고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울 수 있으니까요.
나는 요즘 새 담임 선생님 얘기와 새 짝꿍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 엄마의 학교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불만 투성이입니다. 반 친구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억울하고 불쌍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른들 40명이 모여서 매일 매일 생활한다 해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일인데, 아이들 40명이 한 교실에서 매일 매일…. 게다가 통솔자는 단 1명. 정말 탈이 많을 일입니다.
‘고미 타로’라는 일본의 그림책 작가가 쓴 산문집에서 귀동냥한 얘기지만, 해적들이 조직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발상으로 시작한 것이 ‘학교’라고 합니다. 소설가 무라카미 류는 한 소설의 후기에서, 성장기에 상처를 줬던 학교에 대한 유일한 복수 방법은 그들보다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학교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웬수’ 같은 곳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개성을 죽이는 곳이고, 우리 아이들을 불안하고 억울하게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나 억압이 많은 공간이기에 그 속에서 은밀하게 행했던 작은 일탈들이 어른들에겐 ‘학창시절’이라는 제목으로 추억거리가 되곤 합니다.
일산의 이웃 도서관에서 고양시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급문고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어, 그 일을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집 다음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교실에 놓여 있는 책들이 너무나 조야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서, 정말 좋은 책으로 채워주고 싶다는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진 운동인데, 호응을 얻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실에 책을 보내면 1년 후에는 잃어버리기가 십상이라서, 집에 있는 책 중에서 소장가치가 가장 떨어지는 책들을 보내게 된다 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실 책꽂이는 그런 책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내 아이 혼자 보는 집안의 책들에는 저절로 욕심을 내는데, 다른 아이들과 함께 보는 책들에는 욕심이 나질 않습니다. 1년 후에 책을 잃어버려 못 찾게 되더라도, 남이 가져가고 싶어할 정도의 좋은 책이 1년 동안 아이들 품을 옮겨다닐 수 있다면 손해보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은 학부모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그 아이의 교실에 좋은 책을 넣어주는 방식인데 발송비라도 줄이려는 생각에 직접 책 배달을 나선 그 도서관은, 학교 측에서 책 받기를 부담스러워하더란 얘기를 전했습니다. 중학교 때, 쉘 실버스타인의 어느 그림책에서 ‘껴안기 싸움’이라는 낱말을 보았는데, 살아가면서 그 말이 자주 떠오릅니다. 싸움은 어느 편은 지고 어느 편은 이기는 것이지만, 껴안기 싸움은 양편이 함께 이기는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학교’를 비롯한 우리를 억압하는 제도들이 우리의 적이라면, 우리를 둘러싼 이웃들이 우리와 경쟁을 벌이는 적이라면, 껴안기 싸움을 해보고 싶습니다. 무라카미 류의 복수처럼 야곰야곰 싸움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되도록 껴안기 싸움을 말입니다.
봄날입니다. 예쁜 꽃이 핀 화분을 사시거든 집안에 놓지 마시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계단에다 두시길 권합니다. 누군가 집어갈까 두려워하지 말고서. 집어갈 사람은 집어가더라도, ‘그냥’ 그렇게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웃을 믿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고도 그냥 해봄직한 작은 싸움일 듯합니다.
경향신문[향기가 있는 아침]
2002년 7월 19일 (옮긴이:류기우)
나는 동네에서 조그마한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이 왔으니, 함께 봄 냄새가 맡고 싶어서 예쁜 꽃을 사다 계단참에 놓았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한마디씩 건넵니다. 봄이 느껴져서 좋다며 따뜻하게 웃어줍니다. 우리 집에도 이런 꽃 사다놔야지, 혼잣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씨익 웃곤 하지만, 속마음까지 웃어지진 않습니다. 좋은 걸 보면 ‘우리 집’ 혹은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쁜 화분을 살 때 하나 더 사서, 우리 도서관에 선물해 달라 말하고 싶기도 하고, 애들 학교 교실에 갖다 주라고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울 수 있으니까요.
나는 요즘 새 담임 선생님 얘기와 새 짝꿍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 엄마의 학교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불만 투성이입니다. 반 친구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억울하고 불쌍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른들 40명이 모여서 매일 매일 생활한다 해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일인데, 아이들 40명이 한 교실에서 매일 매일…. 게다가 통솔자는 단 1명. 정말 탈이 많을 일입니다.
‘고미 타로’라는 일본의 그림책 작가가 쓴 산문집에서 귀동냥한 얘기지만, 해적들이 조직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발상으로 시작한 것이 ‘학교’라고 합니다. 소설가 무라카미 류는 한 소설의 후기에서, 성장기에 상처를 줬던 학교에 대한 유일한 복수 방법은 그들보다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학교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웬수’ 같은 곳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개성을 죽이는 곳이고, 우리 아이들을 불안하고 억울하게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나 억압이 많은 공간이기에 그 속에서 은밀하게 행했던 작은 일탈들이 어른들에겐 ‘학창시절’이라는 제목으로 추억거리가 되곤 합니다.
일산의 이웃 도서관에서 고양시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급문고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어, 그 일을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집 다음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교실에 놓여 있는 책들이 너무나 조야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서, 정말 좋은 책으로 채워주고 싶다는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진 운동인데, 호응을 얻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실에 책을 보내면 1년 후에는 잃어버리기가 십상이라서, 집에 있는 책 중에서 소장가치가 가장 떨어지는 책들을 보내게 된다 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실 책꽂이는 그런 책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내 아이 혼자 보는 집안의 책들에는 저절로 욕심을 내는데, 다른 아이들과 함께 보는 책들에는 욕심이 나질 않습니다. 1년 후에 책을 잃어버려 못 찾게 되더라도, 남이 가져가고 싶어할 정도의 좋은 책이 1년 동안 아이들 품을 옮겨다닐 수 있다면 손해보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은 학부모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그 아이의 교실에 좋은 책을 넣어주는 방식인데 발송비라도 줄이려는 생각에 직접 책 배달을 나선 그 도서관은, 학교 측에서 책 받기를 부담스러워하더란 얘기를 전했습니다. 중학교 때, 쉘 실버스타인의 어느 그림책에서 ‘껴안기 싸움’이라는 낱말을 보았는데, 살아가면서 그 말이 자주 떠오릅니다. 싸움은 어느 편은 지고 어느 편은 이기는 것이지만, 껴안기 싸움은 양편이 함께 이기는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학교’를 비롯한 우리를 억압하는 제도들이 우리의 적이라면, 우리를 둘러싼 이웃들이 우리와 경쟁을 벌이는 적이라면, 껴안기 싸움을 해보고 싶습니다. 무라카미 류의 복수처럼 야곰야곰 싸움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되도록 껴안기 싸움을 말입니다.
봄날입니다. 예쁜 꽃이 핀 화분을 사시거든 집안에 놓지 마시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계단에다 두시길 권합니다. 누군가 집어갈까 두려워하지 말고서. 집어갈 사람은 집어가더라도, ‘그냥’ 그렇게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웃을 믿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고도 그냥 해봄직한 작은 싸움일 듯합니다.
경향신문[향기가 있는 아침]
2002년 7월 19일 (옮긴이:류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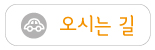



 Powered by XE
Powered by XE